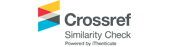Review Article
심장재활 참여의 저해 요인
이장우
1
,
*
Barriers to Participation in Cardiac Rehabilitation
Jang Woo Lee
1
,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
1Department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Goyang 10444,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Jang Woo Lee, M.D., Ph.D. Department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100, Ilsan-ro,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10444, Republic of Korea, Tel : +82-31-900-3509, E-mail :
medipia29@nhimc.or.kr
© Copyright 2025 The Korean Space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Jun 18, 2025; Accepted: Jun 27, 2025
Published Online: Jun 30, 2025
Abstract
Cardiac rehabilitation (CR) is a proven secondary-prevention strategy that improves exercise capacity, quality of life, and survival in cardiovascular disease patients. Despite numerous efforts, the participation rate in cardiac rehabilitation remains low. In Korea, reimbursement for CR was implanted later than in other countries with advanced health-care systems, and CR participation rates are reported to be even lower. Accordingly, systematically identifying the barriers that disturb CR participation and devising targeted countermeasures are essential to effective cardiovascular disease management. Patient-level obstacles include female sex, advanced age, low socioeconomic status, limited geographic access to CR centers, and a high burden of comorbid conditions. On the healthcare provider and hospital aspect, insufficient awareness of CR, weak physician endorsement, and the high fixed and operating costs required to maintain programs hinder uptake. Despite robust evidence supporting the cost-effectiveness of CR, policy-level support for wider implementation remains inadequate. This gap is especially evident for emerging, evidence-based digital and hybrid CR models, for which technological advances have not been matched by commensurate reimbursement or regulatory frameworks. A thorough appraisal of these limit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context-specific strategies to address them are urgently needed. All-cause and cardiac mortality and enhances functional capacity and quality of life, yet uptake remains poor-about 30-40 % of eligible patients in high-income nations and < 10 % in Korea attend. To clarify this evidence-to-practice gap, we reviewed English and Korean literature (2010-2024) on barriers to CR engagement and synthesised findings using the 2024 revised Cardiac Rehabilitation Barriers Scale (CRBS-R). Patient-level impediments include female sex, older age, low socioeconomic status, travel times exceeding 60 minutes, multimorbidity (e.g., diabetes, chronic kidney disease) and heart-failure diagnosis-all consistently associated with lower referral and enrolment. Provider and hospital barriers comprise limited physician awareness or endorsement, cumbersome referral workflows and restricted programme capacity; high start-up costs, space constraints and staffing shortages confine CR services to tertiary centres, exacerbating rural inequities. Policy barriers involve inadequate insurance coverage, residual out-of-pocket expenses despite reimbursement, and the absence of distinct fees for remote or hybrid CR, even though meta-analyses confirm such models are cost-effective and clinically non-inferior. These patient, institutional and systemic factors interact to suppress CR uptake; recognising their interplay is essential for designing multifaceted, context-specific strategies that can expand equitable access and optimise cardiovascular secondary prevention.
Keywords: Cardiac rehabilitation; Participation; Barriers
서론
심혈관질환은 국내외에서 여전히 주요 사망·장애의 원인이며, 이에 대한 대표적 2차 예방 전략으로 심장재활이 확립되어 있다. 심장재활은 관상동맥질환이나 심부전과 같은 심혈관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과 운동 능력,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에 대해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의료 선진국에서도 심장재활 참여율이 대상 환자 중 30–40% 정도에 그치며[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기준으로 10%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4,5]. 이러한 근거–현실 간 격차는 심혈관질환자의 재발과 재입원 위험을 키우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심장재활 참여 저조 원인은 여러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심장재활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다차원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자원 효율화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환자, 의료진과 병원, 정책 요인의 세 범주로 나누어 심장재활 참여 저해 요인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개선 전략 수립에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1. 환자 요인
다수의 관찰 연구에서 여성과 고령층에서 남성과 중장년층에 비해 심장재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된다[6,7]. 이러한 격차는 보호자 역할, 신체 이미지, 운동 불안 등 사회문화적·심리적 요인이 교차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가정을 더 중시하는 사회 풍조로 인해 심장재활의 필요성에 대해 좀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지위 또한 심장재활 참여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8]. 특히, 국내 연구에서 본인부담금이 없는 의료급여 환자에서 심장재활 참여율이 낮게 보고되는 것으로 보아 비단 의료 비용뿐만 아니라 심장재활 참여로 인한 기회비용이나 부대 비용 등이 심장재활 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9].
병원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지리정보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에서 병원까지 60분 운전 거리를 기준으로 심장재활 의뢰와 등록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하지만 동일 연구에서 일단 심장재활에 참여하게 되면, 병원까지의 이동시간은 심장재활 프로그램 이수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만성신질환 등과 같은 동반 질환을 지닌 환자에서 심장재활 참여율이 더 저조하다고 알려져 있다[11]. 운동에 대한 두려움, 피로, 무기력감 등으로 심장재활 참여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의 재발 위험이 더 높아 심장재활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상동맥질환자보다 심부전 환자에서 심장재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과 그로 인한 동반 질환, 만성적인 질병 경과, 낮은 심장재활 의뢰율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2].
환자 요인은 이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땅치 않다. 환자의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고 아래 기술할 의료진 및 병원 요인과 정책 요인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2. 의료진 및 병원 요인
의료진의 인식 부족과 심장재활 효과에 대한 낮은 권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 심장재활의 효과가 입증되었고, 여러 임상진료지침에서 심장재활을 필수 치료로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의료진들이 환자들에게 심장재활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13]. 그 원인으로 심장재활의 효능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나 심장재활을 의뢰하고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과정의 복잡성 등이 작용한다[14].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높은 초기 비용이 요구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간과 장비, 의료 인력 교육이 필요하고, 인건비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유지 비용이 발생한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불투명하거나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심장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15]. 이는 도시의 대형 병원에 심장재활 센터가 편중되고, 농어촌 및 지방의 중소 병원은 물리적·인력적 여건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접근성이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단기간 내에 환자들의 심장재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요인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많이 드는 심장재활을 비단 의료진과 병원의 몫으로만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정책 요인
많은 국가에서 심장재활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주요 보건 정책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16,17]. 그중 첫번째 단계로 심장재활에 대해 적절한 건강보험 적용이 권고된다[18].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의료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2017년 2월부터 심장재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재활 참여율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5]. 심장재활이 급여화되었다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부담금은 여전히 많은 환자들에게 부담이 된다[8].
가정과 병원 심장재활의 장단점을 겸비한 원격 혹은 하이브리드 심장재활이 거리와 시간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19], 다수 보험자와 국가 보장체계가 아직 이에 대해 별도 수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가 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원격 심장재활이 대면 치료와 비교하여 효과가 열등하지 않으며 비용 측면에서 우위에 있음을 메타분석을 통해 확인했으나, 정책 반영은 더딘 실정이다[20]. 심장재활 프로그램의 지리적, 시간적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의료 기관 이외에 지역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공 혹은 민간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여겨지나[21], 이들을 실질적인 심장재활 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제도적 난관이 많다.
심장재활은 심혈관질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며, 재발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생존, 특히 건강수명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충분히 증명된 치료 방법이다. 심장재활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효과로 얻는 이득을 고려하면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큰 이득이 있음이 이미 밝혀졌다[22]. 따라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심장재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결론
심장재활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을 크게 환자, 의료진 및 병원, 정책 요인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들은 독립적이 아닌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령, 만성질환이 동반된 환자에게 높은 강도의 심장재활 권고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진료시간과 인력의 투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심장재활에 참여하는 환자와 심장재활을 운영하는 기관의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제적,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심장재활 참여 저해 요인은 문화적, 시대적인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에 각 국가와 지역에 맞는 시의적절한 파악이 필요하다. 결국 심장재활 참여를 저해하는 교차적, 복합적 저해 요인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